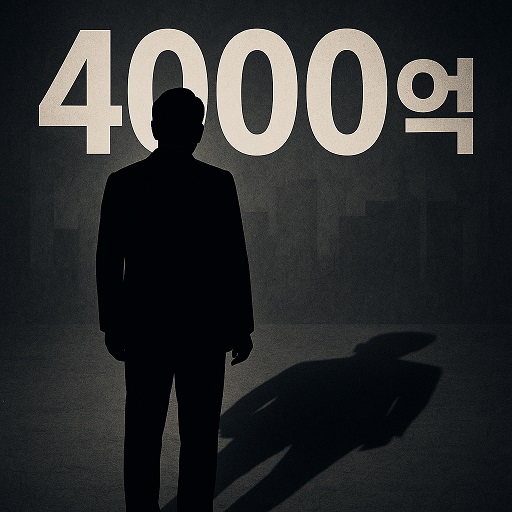
조선일보에 게재된 박정훈 칼럼은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4,000억 도둑질 완성해 준 최후의 조력자, 그분.”
이 문장은 특정 사건 자체를 넘어서,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에서 반복돼 온 “그분 프레임”을 정확히 겨냥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 가장 곤란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사회는 알고 있다.
칼럼의 핵심은 단순하다. 4,000억 원 규모의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었으며, 그 최종 승인 구조는 결국 정점의 권한을 가진 인물에게 닿는다는 것이다. 이 논리 전개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매우 불편한 지점이다.
1. 왜 지금 ‘그분’ 프레임이 다시 살아났는가
최근 정치 지형을 보면, 이재명에게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특검·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상승
- 민주당 내부의 ‘지키기 피로감’ 축적
- 언론의 시선이 다시 돈 흐름·결재 구조로 이동
이런 시점에 박정훈 칼럼은 “최종 조력자”라는 표현을 쓰며 정점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정치적 언어도 아니다. 완전히 구조적이고 행정적이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다.
2. 이재명이 가장 취약한 지점: ‘구조적 책임성’
정치 공방에서는 여러 프레임을 동원해 방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의 흐름, 사업 구조, 최종 결재 라인은 다른 문제다. 이재명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프레임이 바로 이것이다.
-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 “최종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나?”
-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가?”
칼럼은 바로 이 부분을 정조준한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행정적 책임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3.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안 신호’로 읽힌 이유
민주당의 공적 메시지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 계속된 방어
- 사법 리스크의 누적
- 지지층의 피로도 상승
- 총선 이후의 균열
이런 상황에서 “그분 프레임”이 살아나면 당 전체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재명을 위한 방어’가 당의 명분보다 앞서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이 타이밍에 칼럼이 터지면 내부 결속보다 내부 균열이 먼저 오는 구조이다.
4. 심리학적으로 보면: ‘회피적 리더십’의 위기 반응
정치심리학에서 지도자는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① 외부 공격 프레임 강화
“검찰의 음해다”, “정치적 탄압이다”, “반대 세력의 공작이다.”
② 내부 결속 프레임 요청
“지켜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전체의 문제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두 프레임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번 칼럼은 도덕성·정치성보다 행정 책임성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강하게 반박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5. ‘그분’이라는 상징이 던지는 문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국 정치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한 지칭이 아니다. 권력 구조의 정점, 실제 책임자, 숨겨진 지휘 라인을 암시하는 상징이다.
대장동 사태에서도
쌍방울 사태에서도
백현동 의혹에서도
이 프레임은 반복돼 왔다. 박정훈 칼럼이 던진 것은 단지 사건 하나의 평가가 아니다. 문제의 초점을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정리: 이재명은 왜 불안해지는가
- 사법 리스크가 누적된 타이밍에
- 구조적·행정적 책임을 건드리고
- 내부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 가장 민감한 ‘그분 프레임’을 부활시키고
- 반박이 쉽지 않은 형태의 논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프레임을 다시 여는 ‘신호탄에 가깝다. 이재명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하고, 실제로도 불안할 만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