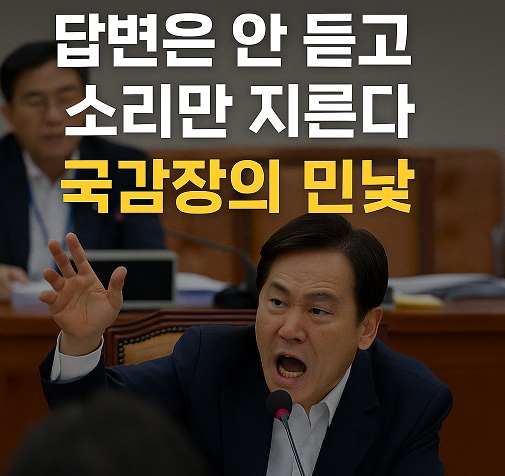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지수 4,000선 붕괴 이후 언론에 ‘붕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오늘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불안하고, 동시에 뻔뻔한지가 모두 드러나 있다.
언어를 통제하려는 권력은 ‘수치심’을 잃은 권력이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경제 위기 앞에서 책임의 언어를 사용한다. “국민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신뢰의 기본 문법이다. 하지만 수치심이 마비된 권력은 현실을 고치는 대신 단어를 고친다. ‘붕괴’를 ‘조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불안’을 ‘오해’로 바꾸며 진실의 외피를 벗겨낸다. 수치심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감정이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권력은 자기 언어를 믿는 착각에 빠진다. 그 착각이야말로 진짜 붕괴의 시작이다.
진짜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감각의 마비’다
경제는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치심이 사라진 감각은 복구가 어렵다.정치가 언론의 단어를 금지하는 순간, 국민은 ‘정부가 현실을 볼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받는다. 그 신호는 수치심을 잃은 권력이 스스로 양심의 회로를 끊었다는 선언과 같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다”
는 집단적 자기최면이다.
‘수치심의 부재’는 통제욕으로 변한다
정치가 도덕적 긴장을 잃으면, 대신 심리적 통제욕이 자라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말’로라도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늘 똑같다. 진실은 감춰지고, 불신은 커진다. 국민은 “이제는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수치심은 권력의 가장 인간적인 브레이크다
수치심은 권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유일한 감정이다. 권력이 부끄러움을 잃을 때, 언론의 표현은 금지되고 국민의 언어는 검열된다. 그렇게 사회는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한 세계로 회귀한다.
“붕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숨기려는 순간, 진짜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마무리
수치심을 잃은 정치의 언어는 언제나 현실을 왜곡한다.그들은 위기를 가리려 하지만, 결국 가린 건 자신들의 얼굴이다.
“진실을 감추는 부끄러움보다,
부끄러움을 감추는 진실이 훨씬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