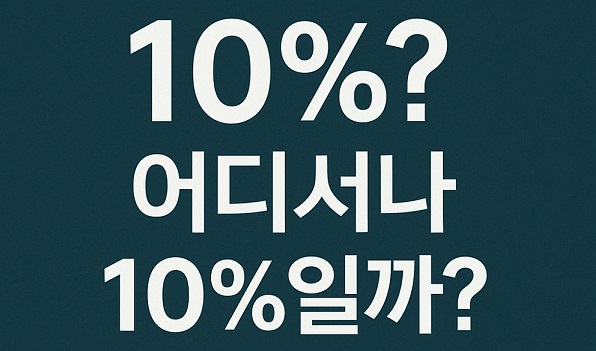
뉴스 요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고 그중 우리 당원명부에 500만 명이 있다. 즉,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다. 그러므로 어떤 명단이든 120만 명이 있다면 그중 약 12만 명은 우리 당원일 개연성이 많다.”
얼핏 들으면 수학적으로 타당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리적·통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 심리학적 해설
- 잘못된 독립성 가정
전체 국민 중 10%가 당원이라는 사실을, 특정 집단(통일교 신도 120만 명)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집단(당원, 통일교 신도)은 서로 독립이 아닐 수 있으며, 실제 비율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부 확률인데, 이를 무시하고 단순 곱셈으로 계산해 버린 겁니다.
- 숫자의 권위 효과
“500만, 120만, 12만”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 주장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거 없는 추정치인데도, 숫자가 주는 권위 때문에 “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 통계적 오류의 정치적 활용
숫자와 확률을 언급하면 “객관적”인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 적용된 통계는 오히려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특정 주장에 설득력을 인위적으로 부여합니다.
- 인지적 게으름(cognitive laziness)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10%면, 어디서나 10%겠지”라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논리적 검증을 하지 않고 직관적 계산에만 의존하는 경향이죠. 정치적 발언은 바로 이런 심리를 노린 경우가 많습니다.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은 숫자와 통계를 동원한 주장을 들을 때, 얼마나 비판적으로 검토하시나요? “전체 평균치”를 “특정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말,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누군가 구체적 수치를 들이밀며 논리를 펼칠 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져 진위를 가려내시나요?
👉 이번 사례는 단순히 정치 발언을 넘어, 숫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쓰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적 안목으로 보면, “그럴듯하다”는 느낌 뒤에 숨은 오류를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