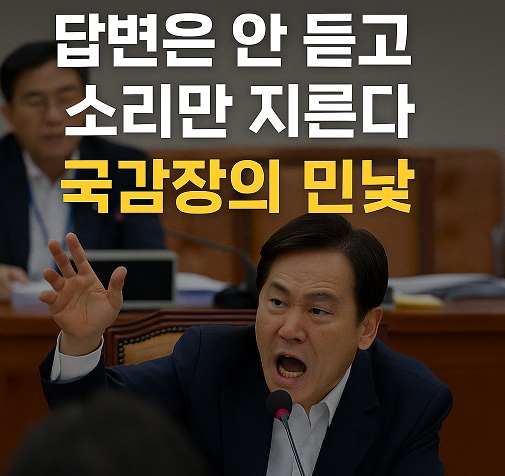① 복기왕 의원의 ‘15억이 서민아파트’ 발언
2025년 10월 23일, 복기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치로 보면 15억 원대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억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후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실거주도 힘든 주택가격을 서민 수준이라니 현실감각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온라인에선 “서민 기준이 15억이라니”라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② 이상경 차관 논란 및 ‘부동산 을사오적’ 표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서 사라”는 취지의 발언과,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정부 정책 책임자들을 가리켜 “2025 부동산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을사오적’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매국노 다섯 명을 칭하던 말로, 여기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의미로 비유된 표현입니다.
③ 본질적 문제
높은 집값과 대출·투자 규제가 맞물려 서민·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책 설계자 혹은 책임자의 발언이 국민의 현실과 괴리되었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15억이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발언이나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 등은,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에게는 전혀 닿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책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처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 심리학적 해설 – 수치심의 부재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수치심(shame)이라는 감정은 공동체가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제동을 거는 감정입니다. 권력이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현실에서 실패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반성이나 책임감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수치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위 발언과 표현들은 권력자들이 다른 현실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이는 결국 국민과의 정서적 단절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기 예외주의(self-exemption)’가 작동됩니다. “우리(권력자)는 다르다”는 태도가 반복되면, 수치심을 느껴야 할 순간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 내부의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 규범이나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치심 잃은 사회’의 하나의 징후입니다.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권력자나 정책 책임자의 발언이 현실감이나 공감 없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먼저 느끼시나요? 분노, 배신감, 혹은 무력감 중 어떤 것이 더 컸나요? ‘서민’이라는 말이 정책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정책·발언이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다고 보시나요? 이러한 권력과 국민 사이의 정서적 간극이 커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신뢰 회복을 요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