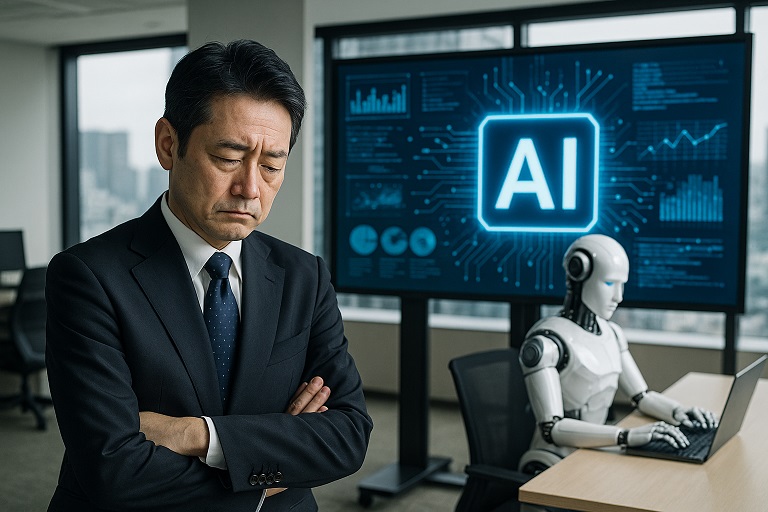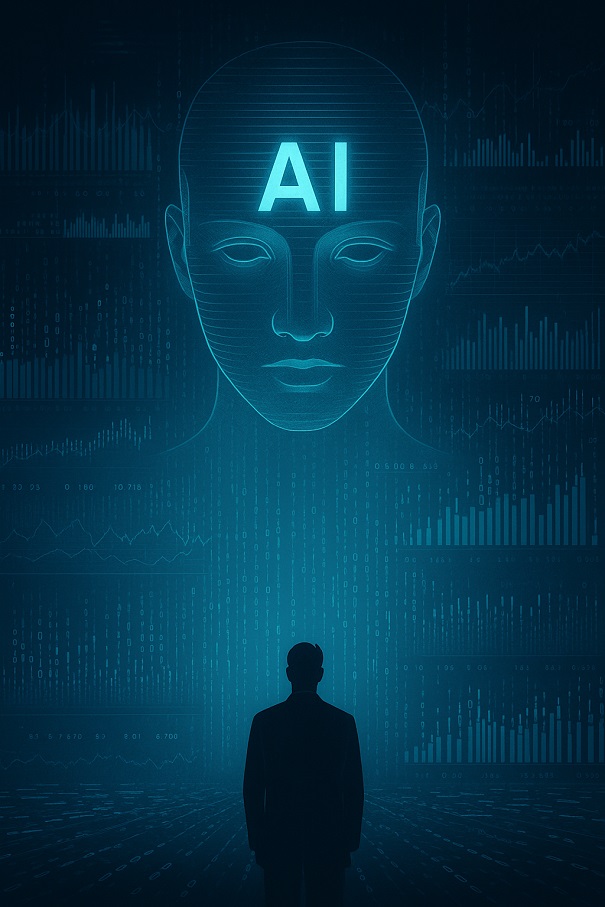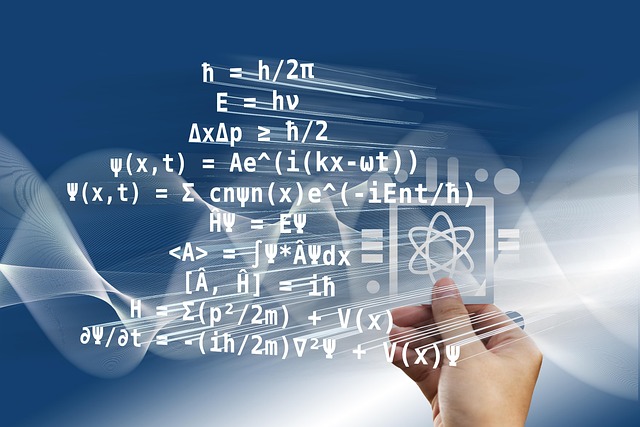
사람들은 의외로 AI에게도 “고마워요”, “부탁해요”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기계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왜 우리는 예의를 차릴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컴퓨터와 대화할 때도 사회적 규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클리퍼드 나스(Clifford Nass) 교수는 이를 “미디어 방정식(Media Equ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대할 때 실제로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듯이 사회적, 본능적인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컴퓨터를 직접 평가할 때, 다른 컴퓨터에서 할 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손함(politeness)’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컴퓨터가 나를 보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낄 때,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컴퓨터에게 예의를 갖춰 답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현상은 “미디어=현실”이라는 미디어 방정식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컴퓨터, 챗봇, AI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CASA(Computers Are Social Actors)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디어, 특히 컴퓨터를 사회적 존재로 보고 감정, 성격, 전문성, 팀 소속감,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미디어에도 투영하며 대응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종종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즉, “사람에게 하는 방식이 미디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에게 직접 “님에게도 존댓말 쓰는 사람들이 많나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래는 AI의 대답입니다
“저에게 존댓말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 예절이나 감정을 느끼지 않지만, 많은 사용자분들은 대화를 존중하고 예의 있게 진행하고자 존댓말을 사용하시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AI를 상담사나 선생님 같은 역할로 받아들여 존댓말을 더 자주 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면 젊은 층은 AI를 놀이 상대처럼 느껴 비교적 자유롭게 반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최근 AI 플랫폼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용자는 AI와 대화할 때 20% 정도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반면, 20대는 5%, 10대는 3% 정도로 훨씬 적게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인화(anthropomorphism)는 인간 뇌의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순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심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 “오늘 기분 어때?”라고 묻기도 하지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태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습관은 인간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전이 효과를 만들 수 있고, AI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습관’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은 AI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