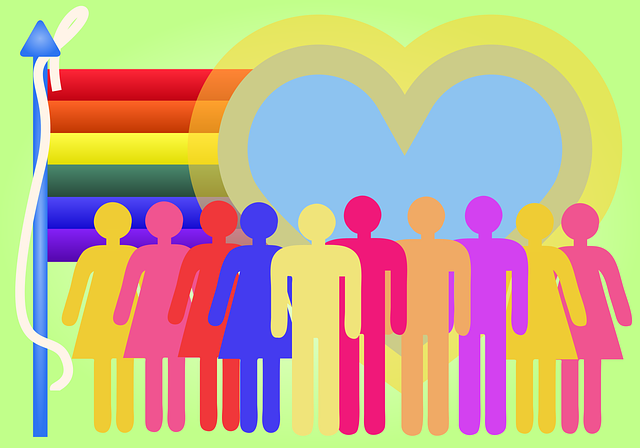
Guardian지에 실린 기사입니디.
최근 한국에서는 남녀 사이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 수준을 넘어, 인터넷 공간·정치적 담론에서 ‘젠더 혐오(misogyny / misandry)’가 주요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성 권리 집단(men’s rights)’ 또는 반(反)페미니즘 커뮤니티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죠.
한편, 젊은 남성들의 불만은 단순히 “여성들이 특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불안정, 취업 불확실성, 군복무 등 현실적인 부담과 기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좌절감도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여성 중심 목소리 확대가 때로는 ‘거울’ 전략(mirroring, 반격적 발언)이나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어져, 양쪽 모두에게 피로감과 불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심리학적 해설
이 현상에는 여러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 중입니다:
-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
과거 세대에 비해 기회가 줄었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자신이 기대했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분노나 좌절이 커집니다.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감정이 젠더 갈등으로 투사되기 쉽습니다.
- 소속감/정체성 강화 욕구 (Social Identity Theory)
특정 집단(예: “남성”, “피해받는 남성”, “반(反)페미니즘 지지자”)으로부터 정체성을 얻고,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런 소속감을 쉽게 제공합니다.
-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 집단극화 (Group Polarization)
반페미니즘 커뮤니티나 페미니즘 커뮤니티 모두,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는 장소가 많아짐 → 의견이 점점 극단으로 치우침.
“내 관점이 맞다”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 의견은 무시하거나 적대적으로 해석함.
- 불확실성 회피 및 스트레스 반응
사회·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클 때, 사람들은 보다 간단한 이야기, ‘책임자 찾기’ 프레임, 명확한 적(‘페미니즘’, ‘남성 특혜’)을 설정하고 싶어함.
이렇게 되면 복잡한 구조적 문제(교육, 노동시장, 군복무, 가사분담 등)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왜곡됨.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은 젠더 갈등이심리적인 불안이나 불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법·제도·사회적 관념) 변화가 더 결정적이라고 보시나요?
‘혐오적 언행’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언행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 수준에서, 또는 사회적 수준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 접근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