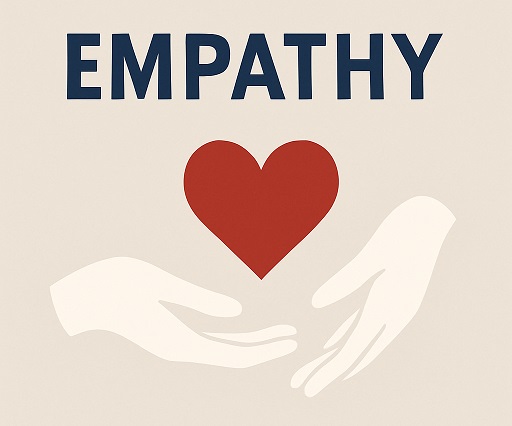정치에서 가장 흔한 역설은 ‘선의를 가진 조치가 꼭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권이 내놓는 검찰청 폐지와 같은 여러 조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개혁을 위해 내세우지만,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한 의도와 다른 현실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라는 개념은 사회학자 맥스 베버가 강조했고, 경제학자 로버트 머튼이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그 효과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타나거나, 전혀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죠.
예컨대 여권이 추진하는 법조 개혁이 ‘사법 정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인의 방패막이로 작동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무너지고, 국민들의 냉소만 깊어질 것입니다.
사례 1: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효과
정치권력의 ‘공정 강화’라는 기치 아래 진행되는 입법 시도는 오히려 불공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권력자만 보호된다’는 냉엄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단기 성과가 장기 위험으로
경제 정책에서도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 민생 지원을 내세운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물가 불안을 키우며, 결국 더 큰 민생 불안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위해 내린 결정이 내일의 부담을 눈덩이처럼 키워놓는 셈이죠.
심리학적 교훈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결과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정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로 추진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부작용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사회 제도는 복잡계입니다.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커져 의도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맺음말
지금 여권의 조치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의도했는가’가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정책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야말로 정책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국민의 눈에 비친 풍경이 ‘더 나빠졌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처럼 딴 꿍꿍이가 있는 여권 조치들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