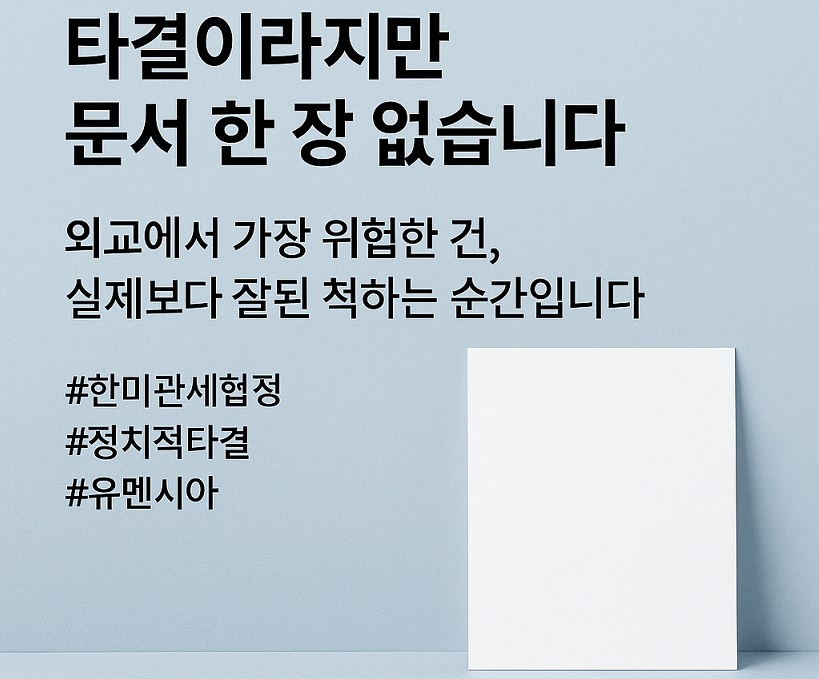
APEC 정상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문서 없는 타결’이라는 이상한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다수의 MOU(양해각서) 를 교환하며 협상의 구체적 틀을 남겼지만, 한미 간에는 어떠한 공식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의 정상적 절차
헌국과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에너지 협력, 다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드린 전환 등 총 7건의 MOU 가 체결됐다. 일본 역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을 포함한 MOU를 공식 문서로 남겼다. 이 두 사례는 정상 외교의 기본 절차를 따른 것이다 — 즉, 발표 이전에 문서가 있고, 서명 이후에 언론이 보도하는 ‘정상 순서’ 가 지켜졌다.
한미만 문서가 없는 이유
그러나 한미 관세협정은 “타결됐다”는 말뿐이다. 미국의 팩트시트는 공개됐으나 한국은 팩트시트를 ‘작성 중’이며, MOU는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세부 문안이 아직 조정 중이라는 뜻이고, 실제 ‘타결’이 아니라 정치적 포장에 가까운 선언아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시장 완전 개방”과 “농수산물 협의 지속”을 강조했지만, 한국 측은 “쌀과 농업은 지켰다”고 설명한다. 이 상반된 설명이야말로 문서 부재의 가장 큰 증거다.
정치적 타결의 심리
정상회담에서 ‘문서 없는 타결’이란, 실제 합의보다 국내 여론용 메시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정치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쪽이 ‘타결’을 먼저 외치고, 실무진은 뒤늦게 세부 사항을 메우려다 협상이 더 꼬이는 패턴이다. 이런 형태의 외교는 “상호 신뢰”를 가장 먼저 훼손한다. 문서 없는 약속은 곧 책임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
이제 관심은 ‘팩트시트’ 공개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본·중국이 MOU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한국만 ‘문서 없는 합의’로 남는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로 기록될 것이다. 협상은 결국 심리전이다. 상대가 먼저 ‘타결’을 말할 때, 진짜 협상가는 종이에 싸인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