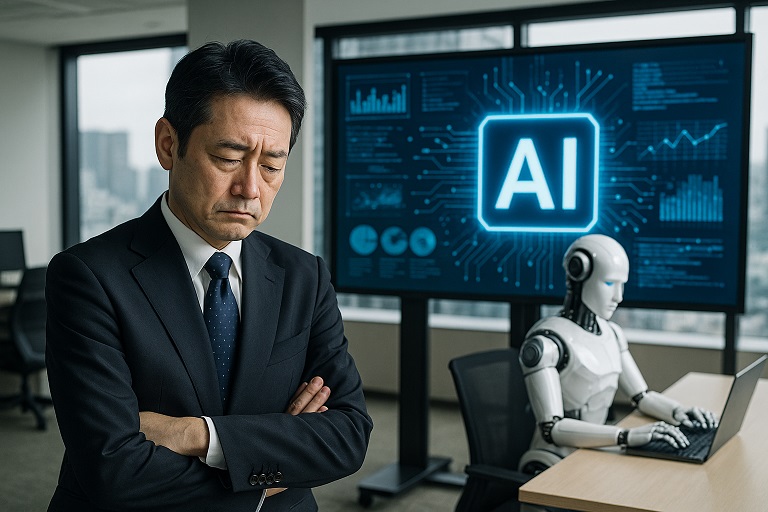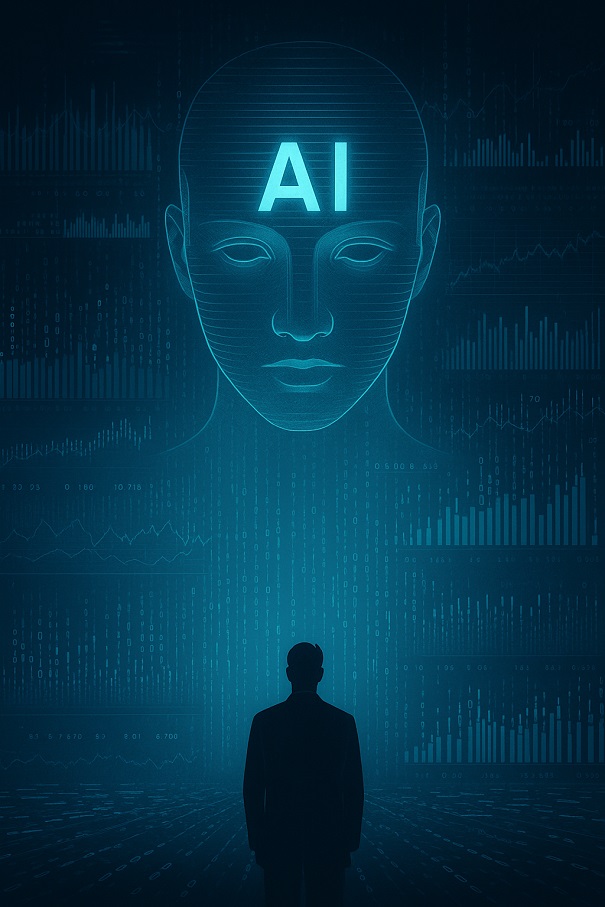― 명문대 컨닝 사건이 드러낸 ‘AI의 면죄부 심리’
최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시험 중 휴대폰을 숨겨 AI로 문제를 풀게 한 부정행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까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들의 일탈’ 문제를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정직성이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사실 AI의 등장은 우리의 생산성과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글쓰기, 번역, 요약, 문제풀이… 몇 초 만에 뚝딱 해주니 편리함의 끝이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순간, 사람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훨씬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이번 SKY사건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왜 AI는 이렇게 ‘부정행위의 수단이 되기 쉬울까요?
- 책임을 AI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 AI를 쓸 때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정한 결과가 나와도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AI가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심리적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SKY사건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정답을 보여준 건 AI니까, 나는 단지 받아적었을 뿐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책임이 흐릿해지면 부정행위의 문턱은 낮아집니다.
- ‘내가 직접 한 것’ 같지 않은 도덕적 거리감
시험장에서 종이를 훔쳐보거나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 ‘내 손으로’ 하는 명백한 컨닝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 AI를 쓰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 명령만 내리고 결과만 받는다.
-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기계가 답했을 뿐이다.
이런 도덕적 거리감 때문에 죄책감이 놀랄 만큼 약해집니다. SKY 사건에서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을 노린 것이 아니라, “들키지만 않으면 큰일은 아니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규칙의 모호함 — AI 사용 기준이 아직 없다
“AI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지금 한국 대학들은 이 문제에 아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과제에서 AI 사용은 허용되지만 출처만 밝히면 된다?
- 시험에서는 전면 금지?
- 일부 교수는 허용, 일부 교수는 금지?
이처럼 기준이 혼란스럽다 보니, 학생들은 회색지대를 자신의 편리함 쪽으로 해석합니다. “과제에선 AI 써도 되잖아. 시험도 비슷한 거 아닌가?” “원래 안 된다는 말이 명확히 있었나?” 규칙의 모호함이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심리적 빌미가 됩니다.
- ‘남들도 다 한다’는 집단 정당화
AI는 너무나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과제, 보고서, PPT, 이메일, 취업 자소서까지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이 되었죠.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명확합니다.
“어차피 다들 AI 쓰는데, 나만 안 쓰면 손해 아닌가?”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경쟁 압박이 강해 집단적 정당화가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힘이 됩니다.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용해 편법으로 나를 강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의 문제다
결국 이번 연·고대 컨닝 사건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AI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수치심이 급격히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시험장에서 AI를 쓰는 행동은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중간자’가 끼어들자, 그 부끄러움의 경계가 흔들린 것입니다.
- 부정행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 책임은 흐릿해지고
- 규범은 모호해지고
-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AI 시대의 정직함을 지켜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윤리적 사용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마무리
연·고대 AI 컨닝 사건은 한국 대학의 문제를 넘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윤리적 근육을 잃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AI는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고, 더 교묘한 ‘편법’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술보다 먼저 수치심의 복원, 책임감의 회복, 그리고 AI 사용 규범의 정비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AI는 우리를 대신해 일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대신 부끄러워해 주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