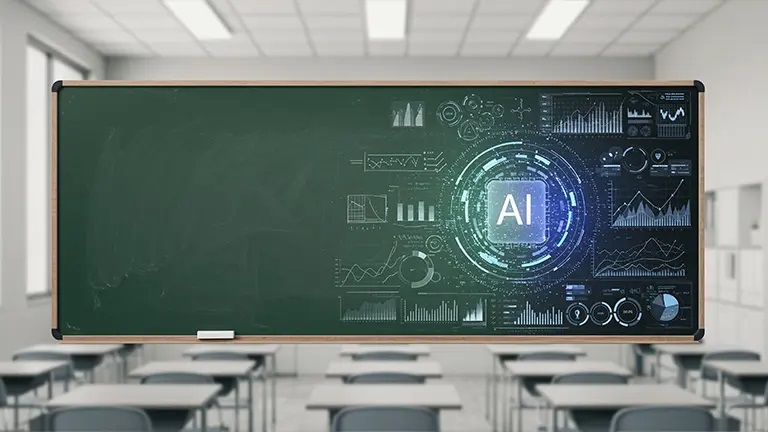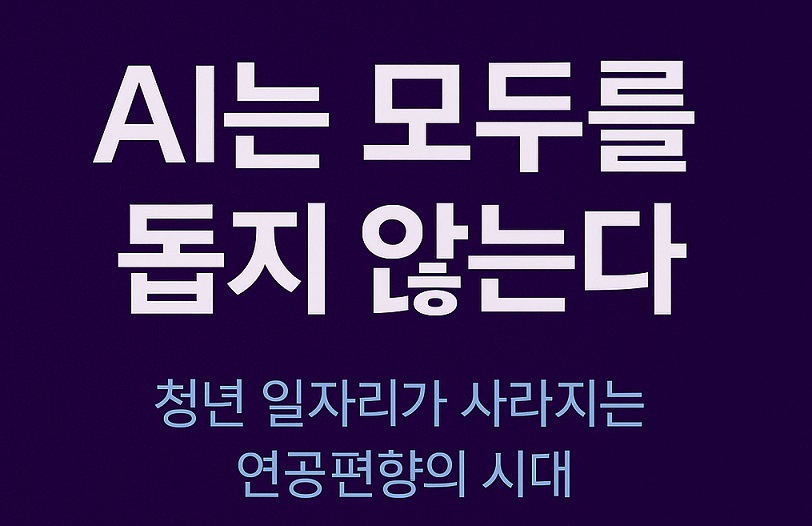
‘연공편향 기술변화’라는 새로운 불평등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불과 3년. 한국은행의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가 21만 개 감소한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 개 증가했습니다.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대부분이 AI에 많이 노출된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한은 연구팀은 생성형 AI 모델인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연령대별 고용 흐름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AI 고노출 업종’은 대표적인 AI 응용 프로그램 10개가 업무와 겹치는 정도가 많은 업종을 한은이 분석해 도출했습니다.
주니어는 줄고, 시니어는 늘고
AI 확산 이후 고용 시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이른바 ‘연공편향(seniority-biased) 기술변화’입니다. AI 기술이 투입되면서 경력이 짧은 인력의 자리가 먼저 줄고, 경력이 많은 시니어의 자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1만 개 중 98%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숩니다. 반면 50대 일자리 20.9만 개 중 약 70%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증가했숩니다, AI는 경험이 적은 주니어의 정형화된 업무(codified tasks)를 대체하지만, 경력에서 비롯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시니어의 업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AI와 ‘보완 관계’의 중요성
하지만 모든 업종에서 같은 양상의 타격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AI에 많이 노출된 산업이라도 AI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청년고용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완도가 낮은 업종: 프로그래밍, 출판, 전문서비스업 → 청년고용 급감
보완도가 높은 업종: 교육서비스, 보건업, 항공운송업 → 고용 안정 유지
AI가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보완적 기술(augmenting technology)’로 전환될 수 있느냐가 향후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임금에는 아직 뚜렷한 영향이 없다
흥미롭게도 AI 확산은 임금 수준에는 아직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 감소가 나타난 업종에서도 임금 격차는 거의 없었죠. 이는 임금 경직성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남아 있는 인력의 생산성 향상으로 평균 임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변화는 임금보다 ‘채용단계에서의 조정’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청년이 더 취약한가?
생성형 AI의 등장은 ‘교과서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직무를 빠르게 대체합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후 업무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경력 5년 이하에서 4% 감소로 가장 컸고, 경력이 쌓일수록 감소 폭이 줄었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석사, 4년제 대졸) AI로 인한 업무 시간 감소율이 더 컸습니다. 죽, ‘중상위 학력의 주니어’가 AI로 가장 쉽게 대체되는 일종의 ‘U자형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는 이 추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인건비 절감보다, 미래 인재 파이프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고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AI 협업 인재 양성,
직무 재설계,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창업·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AI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동반자가 될지는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