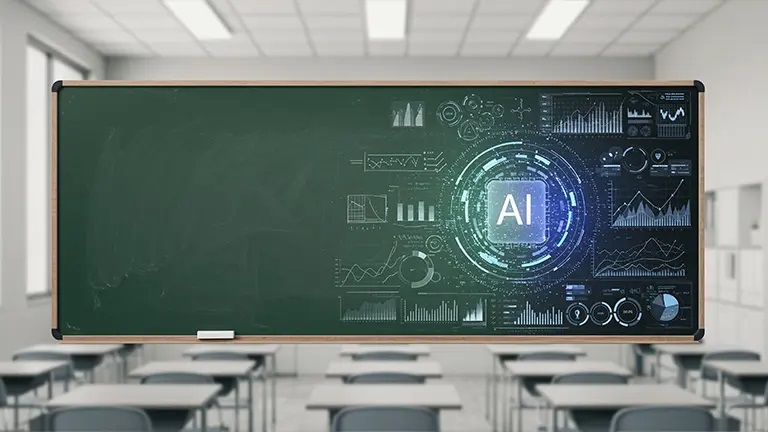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AI의 부적절 사용 때문에 철회된 논문이 20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멀리 있는 학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전반이 겪고 있는 책임 회피·검증 부재·몰염치의 축소판입니다.
1. ‘편리함’이 책임을 대체하는 사회
AI가 글을 쓰고, 문장을 만들어주고, 참고문헌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니 유혹은 커졌습니다. 문제는 연구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검증 절차—사실 확인, 논리 점검, 인용 검증—을 건너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해주는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는 몰염치한 연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 “AI가 틀렸어요”라는 변명
철회 과정에서 반복되는 변명은 늘 같습니다.
“AI가 잘못 생성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한 사람은 연구자입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내놓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걸 검증하지 않고 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책임을 무시한 것입니다. 책임은 도구에게 떠넘기고 면피만 하려는 태도—이것이 오늘의 수치심입니다.
3. 학계의 ‘수치심 마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돼도 학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논문 철회는 연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철회 사실이 알려져도
- 반성은 없고
- 제도 개선 논의는 느리고
- “요즘 다 그러지”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4. 진짜 문제는 “책임 주체의 부재”
AI ‘부적절 사용’은 사실 문제의 표면입니다. 실제 핵심은
책임 주체가 실종된 사회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논문이 나가는데,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문제가 생기면 “AI 때문”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것은 곧 수치심을 느낄 능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무리
AI가 발전할수록 연구 윤리는 더 강화되어야 하고, 책임은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편의는 높아졌지만, 수치심은 사라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오늘의 수치심은,
AI를 핑계 삼아 자신이 저지른 부실을 감추려는 연구자들,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학계의 무감각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