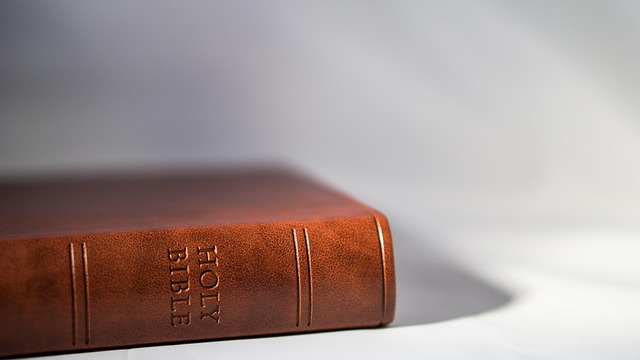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연결된 듯 보이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미국 보건...
심리학으로 읽는 우리 사회
광신은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신념을 집단의 깃발로 들어 올릴 때, 광신은 사회를 뒤흔드는...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손바닥 안에서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창 하나만 열면 정치와...
사회심리학에는 신념 지속 효과(belief perseveran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 형성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쉽게...
우리 사회에서 사면(赦免)은 종종 오해된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수치심은 공동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수치심」은 그 기록입니다. 한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