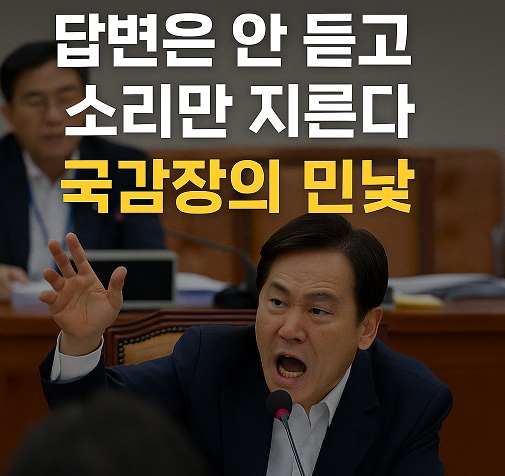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떡값’이 지급됐습니다. 액수는 1인당 425만 원.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고, 보좌진과 차량, 각종 지원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국민 세금으로 수백만 원을 챙깁니다.
특권이 관행으로 굳어질 때
국회의원들의 명절수당은 스스로를 ‘봉사직’이라 부르는 정치인의 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허덕이며 몇 만 원을 아쉬워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은 엄청난 격차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치심 상실이 드러납니다. 수치심은 “내가 누리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가, 타인에게 부끄럽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묻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특권이 제도화되고 반복될수록, 그 감각은 무뎌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수치심이 사라진 사회의 위험
수치심은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제 장치이자 공동체의 균형을 지탱하는 기제입니다.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때 “부끄럽다”는 감정은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됩니다.권력을 가진 자가 수치심을 잃을 때, 사회의 규범과 도덕은 무너집니다. 정치인의 수치심 상실은 결국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이 낭비되고, 불평등은 더 커지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오늘의 수치심
명절에 가족과 나눠야 할 건 따뜻함이지, 부끄러운 특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여전히 자기들만의 ‘떡값’을 챙기며 국민과의 괴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의 수치심은,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