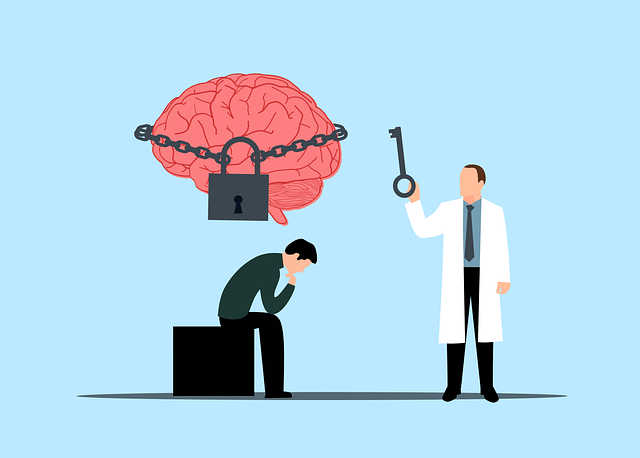
영국 언론 The Times 가 보도한 기사는, 최근 옥스퍼드에서 열린 대형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트라우마(trama)가 일종의 문화적 상품, 또는 심리학계·웰니스 업계의 ‘비즈니스 키워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다룹니다.
원래 임상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특정 상황(전쟁, 학대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었던 ‘트라우마’가,대중 문화와 웰니스 콘텐츠 안에서 ‘마음의 상처 일반’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강연, 웰니스 브랜드, 책, 컨퍼런스 등에서 트라우마 극복 스토리가 소비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개념의 경계가 흐려져, 실제 고통과 덜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 사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개념 팽창(concept creep)”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트라우마가 가진 본연의 심각성과 특수성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 심리학적 해설: 개념 팽창과 마음의 과잉 해석
이 뉴스는 단순한 비판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석하고, 소비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념 팽창 (Concept Creep)이란?
심리학에서는 어떤 개념이 본래 의도된 경계를 넘어 더 넓은 대상에 적용되는 현상을 ‘개념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괴롭힘’이 인간관계 갈등에서 ‘상처 주는 말’ 전체를 포함하게 되고 ‘트라우마’가 누군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힘든 감정까지 아우르게 되는 것이 개념팽창의 좋은 예입니다.
개념 팽창의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의 혼란: 실제 임상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와 일상적 스트레스 사이 경계가 흐려져,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도 ‘상처받았다’는 프레임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반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간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희소성의 상실: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흔해질수록, 그것이 지니는 무게와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트라우마 경험자야”라는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되기보다는 과용된 표현이 될 가능성도 있죠.
자기 프레임 구축: 사람은 의미를 찾아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작은 고통이나 불편도 ‘트라우마’ 레이블로 해석하면, 자신을 특별한 고통의 주인공처럼 느끼게 할 수 있고, 동시에 변화나 회복의 동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트라우마 산업화’가 주목받나?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 스트레스 증가, 자아 탐색 욕구 등이 결합하면서‘마음의 상처’에 주목하는 수요가 커졌고, 상처 치유·극복 이야기에는 감정적 공감과 소비력이 담겨 있죠.
이런 맥락에서 심리 기술(웰니스 앱, ‘마인드풀니스’ 콘텐츠 등)과 결합하면 트라우마는 더 이상 단순한 진단 용어가 아닌 일종의 플랫폼화된 감성 상품이 되는 셈입니다.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이 겪은 감정적 고통이나 어려움, 그것을 스스로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 아니면 그냥 “힘든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트라우마 또는 상처 치유 콘텐츠를 읽을 때, 당신은 위안과 공감을 얻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과 비교하게 되거나 부담을 느끼나요?
우리는 왜 감정적 아픔을 ‘이야기의 재료’ 또는 ‘브랜드 메시지’로 소비하듯 다루는 경향이 있을까요?
만약 내 마음 상태를 설명할 때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면,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싶나요?
오늘은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소비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